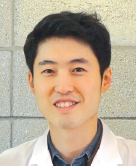
나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빨리 눈이 떠진다. 보통 물이 생각나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 두 컵 정도 마시고 나면 다시 잠을 자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은 물을 먹고 바로 정신이 차려졌다. 전날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많이 먹지 않아서 인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것이다.
아직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는 한 시간 가량 남아 있는데 괜히 내가 부엌에서 소란을 피우면 애들까지 일어날 것 같아 조용히 집밖으로 나와서 아침을 먹으러 차를 탔다.
시원한 국물을 찾아 새벽부터 차를 몰고 찾아간 곳은 소고기 무국집. 군산에서 나름 유명한 맛집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무국이 먹고 싶어져서 집에서 꽤 먼 곳이지만 일부러 찾아갔다. 맑고 투명한 국물에 하얀 무, 아기들 발가락만한 크기로 송송 썰어져 있는 고기 조각, 채 썰은 파, 눈에 보이는 것은 딱 이 3가지 뿐 인데 그것으로 어찌 이런 맛을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밥이 ‘슉슉’ 들어간다.
흔히들 맛집의 음식이라고 하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면서 먹어야 하는 뭔가 특별하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 미식미식 하면서 이 맛 저 맛 다 맛보며 돌아다니다 보니 결국 그 맛의 종착역에는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내가 해준 순백의 새하얀 종지그릇에 담긴 흰 쌀밥이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풍기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결국 많이 먹다보니 나에게 가장 높이 평가를 받는 음식점은 얼마나 집밥에 가까운 맛을 내느냐로 결정 되더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군산의 소고기 무국에 대한 예찬을 이렇게까지 늘여놓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 만족스럽게 속을 달래고 기분 좋게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흔히들 식당에서 계산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말투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생긴 음식점에서 뭔가 불안함에 가득하여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초보 사장님의 말투까지는 많이 겪어 보았었다.

하지만 이 무국집 사장님의 맛있게 하셨냐는 물음은 의문문이 아니라 마치 선언문 같았다. 입으로는 “맛있게 드셨어요?”인데 그 당당하고 힘이 들어있는 목소리와 눈빛으로 인하여 내 귀에는 “어때? 우리 음식 맛있지?”로 들리는 듯 했다. 입으로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있었다.
혼자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였다. 왜 우리 약사들은 이런 존경의 감탄사를 받기가 어려울까? 이것은 의약분업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소리를 지긋이 눌러버렸다.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도 존경받는 약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럼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나도 존경받는 약사가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인터넷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약사님이 손님에게 드링크 박스를 비닐봉지에 담아주면서 비닐이 안 찢어지게 모퉁이를 쿵쿵 테이블에 찍어서 담아드린 미담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시작은 바로 여기서 부터이다. 존경받는 약사가 되는 그 시작은 나에게는 이글을 쓰는 바로 지금부터이고 여러분은 이 글을 읽는 바로 이 순간부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