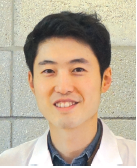
“아들! 냉장고에서 김치 빼서 먹고, 냄비에 갈비 재워놨어.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된다. 밥 다 먹음 전기밥솥 전원 뽑는 것 잊지 말고!”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하교시간과 아버지의 밥시간이 엇갈릴 때면 어머니는 곧잘 메모를 남겨놓고 나가시곤 하셨다. 나의 아버지는 약사이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국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루에 두 번씩 하셨다.
지금 약사가 된지 10년차에 약국일 중에서 약과 관련 없는 것 중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고 하면 나는 단연코 “밥”을 꼽는다. 한 자리에서 5년쯤 되니 정말 먹을 것이 없다. 자장면, 짬뽕, 볶음밥, 국밥, 김밥 몇 가지 메뉴를 돌려가며 먹다보면 매일매일 메뉴 고르는 것이 일이다. 반면에 나의 아버지는 단순히 ‘부지런한’ 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 어떤 숭고한 사명을 해내듯 도시락 임무를 완수한 어머니가 계셔서 적어도 밥 걱정은 안하셨을 것이다. 연세가 일흔이 넘어서도 아직도 그 흔한 혈압, 고지혈, 당뇨를 겪지 않고 현역에서 일하시는 것에 가장 큰 공도 아마도 어머니의 헌신 덕분이었을 것이다.
내가 제법 똘똘해 지고 바구니가 달린 어머니의 빨간 삼천리 자전거 페달에 발이 닿게 되었을 무렵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일 것이다. 자전거를 사달라는 나의 요구에 어머니는 도시락 배달 임무를 물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의 자전거를 나에게 넘기셨다. 그 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드리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셨다.
오늘 점심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도시락이 생각났다. 나도 어머니처럼 아내에게 도시락을 부탁해볼까? 마침 처방전 접수 직원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아내가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방전을 들고 뛰어 들어오는 꼬마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내를 보자 오늘따라 어머니 생각이 더 난다.
내 어머니의 약사아내로서의 삶은 어땠을까? 내가 자라오면서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팔방미인이셨다. 아니 약사의 아내는 팔방미인이어야 할 것이다. 온갖 부류의 손님들이 다 들락날락 거리고 심지어 공중전화기가 약국 안에 있었던 시장통 약국에서 어머니는 약사인 아버지보다 먼저 환자들과 눈을 마주치시며 인사를 하셨다.
“아이구, 또 오셨어요? 아직도 쩔뚝거리며 들어오네~” 아버지가 약으로 환자 몸을 치료하셨다면 어머니는 선한 눈빛에 웃음을 가득 담아 넉살 좋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환자 마음의 빗장을 한 걸음 더 풀어주셨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약국에서 일하실 때 약국에 가면 우리 약국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북적 거렸다.
물론 어머니가 약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나의 유년기는 혼자였던 적이 많았다. 운동회, 소풍, 같은 학교 행사에서 한 번도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90년대에는 맞벌이를 하는 집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내 기억에 우리 집을 제외하고 내가 놀러갔던 친구네 집은 다 집에 어머니가 계셨었다. 세상이 지금처럼 흉흉하지 않던 시절이라 초등학교 3학년이 혼자 버스를 타고 아버지 약국에 찾아가서 울었던 적도 있다. 왜 나는 집에 와도 엄마가 없냐고, 왜 나는 밥도 혼자 차려먹고, 숙제도 혼자 하냐고 아빠가 약사인데 왜 엄마가 약국에서 일을 하냐고 되지도 않는 떼를 쓰며 어머니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 내가 한번 그렇게 떼를 쓰고 난 다음날에는 항상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시곤 하셨다. 그렇게 나는 집에서 혼자 컸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큰 탈선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어갔다.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한 적이 있다. 조금은 철이 든 아들이 조금이나마 집안일에 도움이 되려고 약국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약국에서 전산업무를 내가 직접 보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갑자기 닥친 의약분업 환경에서 컴퓨터를 못하면 약국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입영통지서가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약국 상가 2층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다. 굳이 팜2000을 다루는 데에는 컴퓨터 학원까지 갈 필요는 없었으나, 바코드도, 스캐너도 없던 시절에 50세가 넘은 두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는 약국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탐험해야만 하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틈틈이 타자연습도 하고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였을까? 작은 글씨를 보기위해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돋보기안경 너머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독수리 타법으로 처방전을 입력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점차 능숙해져갔다. 어느새 자판도 안보고 처방전을 입력하시며 “아들 엄마 잘 치지?”라고 웃으면서 말하실 때, 어머니는 정말 일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았다.
시대가 변하고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던 약사 가족의 일상에서 벗어나 어머니 본인께서 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잠시 추억에 젖어있던 나를 현실로 부르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바코드밖에 사용 못하는 아내에게 바코드가 없는 치과 처방전은 비상사태이다. 가짓수만 보면 만만하지만 신규병원등록, 신규의사등록, 신규환자등록까지 하자니 잘 치던 타자마저 독수리 타법으로 변해버렸다. 바쁠 것도 없기에 아내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차분히 하나씩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느리긴 해도 무사히 처방전 입력을 완료하는 아내가 대견스럽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도 이러셨겠지.
점심시간이 다가와 한가한 약국에서 아내는 둘째 아들 문화센터 시간과 첫째 아들 유치원 픽업 시간과 약국에 있을 시간을 배분하느라 고민을 한다. 유모차를 두고 가야 할지, 차를 타고 가야할지, 택시를 타야할지, 한쪽 머리를 쥐어 잡고 고민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낯이 익다. 등을 보인 아내의 뒷모습에서 30년 전 같은 고민을 하였을 약사의 아내, 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다.
“여보 미안한데, 내일 하루는 나 도시락 싸줄 수 있어요?” 영문 모를 도시락 요구에 아내는 흔쾌히 오케이를 외친다. 아직은 내공이 덜 쌓여 조금 서툴긴 하지만 내 아내도 역시 천상 약사의 아내임은 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