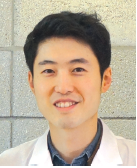
‘친절’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일단 약국을 운영하면서 가장 쉬운 것은 ‘친절하지 않기’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맘에 들지 않은 고객에게 참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쉽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무조건 친절해 지기’이다. 본인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필자는 이 항목에서는 본인 생각에 거의 만점을 획득 했다고 자신한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 친절하기 만점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살면서 큰 불만이 없었고, 혼자 걸어 다닐 때에도 그냥 세상이 즐겁고 행복해서 실실 웃으면서 다니고, 힘이 없게 태어나서 그런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던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엄청난 진상고객이 아닌 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기에 친절하기는 내게 가장 쉬운 분야였던 것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요즘은 깨져가고 있다.
언제나 항상 친절하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하다. 엊그제 퇴근시간에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2명인데 약봉투에 아이들의 약포지 색깔이 안 적혀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이다. 나는 약봉투에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에 맞게 넣어 드렸을 것인데 혹시 제가 바꿔서 넣어드렸나요? 라고 반문을 해보았다. 이름이 적혀져있더라도 봉투 앞에 색깔 표시를 안 해주니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환자는 전에는 적혀져 있더니 이번에는 왜 없냐고 열불을 토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사실 접수데스크 직원이 바뀌면서 전에는 베테랑 직원이 투약하기 전 봉투에 색깔이나 용법 용량을 미리 체크해 놓았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새로운 직원이 아직 일에 서툴러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고 워낙 바쁜 환절기라 틀리지 않고 맞게 넣어주기에 급급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봉투에 색깔을 표시해 주는 것은 내가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환자에게 제공 해준 서비스이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환자는 그동안 받아오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손해 보았다고 생각하였기에 굳이 전화비까지 지불하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그동안 10점 만점의 친절을 제공해 왔다면 1점만 깎여도 불친절한 약국이 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누군가는 아직도 약국에 갈 때마다 무상 음료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무상 음료수를 먹는 누군가 중에 고마운 마음을 느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의약분업과 함께 무상음료수의 나이도 이제 열일곱이 되어가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무상음료수도 이름 좀 있는 브랜드 음료수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브랜드가 아니면 나처럼 되려 항의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는 현재 무상음료수 대신 무상음료수 10개들이 한 박스와 파스 1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까지 간 곳도 있다. 사실이다.
나는 노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고객의 기대심리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 친절해 지기’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적당히 친절해 지기’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습관을 바꾸고, 환자를 적응 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방법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