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전념, 집필보다 가치 있는 번역이 사회에 기여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10년 간 30권 번역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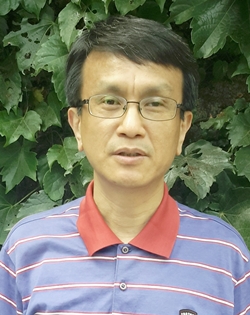
“하루에 12시간씩 번역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그렇게 안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루 12시간씩 해도 5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는 데요.”
새벽 3~4시에 눈을 떠 과학전문 저널인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올라오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분야의 기사를 번역해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보내고 나면 아침 9시 가량. 밥을 먹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앉아 번역을 한다. 과학 분야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병찬 약사의 하루다.
양 약사의 표현을 빌자면 ‘막노동’처럼 번역을 하다 보니 올해만 벌써 3권의 책이 나왔고, 연말까지 3권의 책이 더 출간될 예정이다.
그가 번역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대학생활을 할 때부터이다. 198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외환은행, 대우증권, 대한한공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IMF를 겪으며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노량진 대성학원에서 20살 어린 학생들과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했지만 ‘공부가 체질’인 사람이라 힘들지는 않았다며 양 약사는 웃음을 보였다. 막상 학교를 다니다보니 ‘약사가 되는 것’보다 ‘약학’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다.
문과 공부만 하다 처음으로 접한 식물학, 생화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같은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동급생들이 시험 족보를 외울 때 그는 원서를 찾아 읽었고, 주요 부분을 번역해 나눠주기도 하면서 과수석 장학금을 몇 번이나 타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학, 보건의료, 생명공학 분야 기사를 번역하는 일을 지원하게 됐고 ‘박사 졸업’이 자격요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석사 졸업장만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
졸업 이후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근무약사 생활을 거쳐 서울시 구로구에서 개국을 했지만 번역일을 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약국을 열며 본격적으로 출판계에 뛰어들었다. 약학강의를 듣다가 ‘원서나 제대로 읽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심에서 해당 출판사에 챕터 하나를 번역해서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약학전문서적만 번역했지만 기후변화나 경영·경제학 서적, 스포츠나 소설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재작년부터는 약국을 접고 완전히 과학 분야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한 책이 10년 동안 30권에 달한다.
양 약사는 “번역을 맡는 기준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맡는 편”이라며 “일종의 책임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책을 직접 집필할 생각은 없다. 한 글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의 성격에 조금이라도 부풀리거나 대충 쓰는 ‘책 같지 않은 책’을 내고 싶지 않아서다. 그는 대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읽힐 수 있는 ‘고전’을 번역하는 일이 집필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스스로를 ‘지식공유자’라고 칭하며 적은 번역료에도 “밥만 굶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하지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한국 출판계에도 번역이 대접받는 문화가 하루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인 아내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며 “중앙대 약대를 다니고 있는 딸아이와 더불어 가족들의 이해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을 맺었다.

